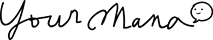백성민의 말과 춤
작가는 한동안 말과 놀았다. 그런데 이제는 춤을 춘다. 그런 만화가 백성민을 만화평론가이자 청강문화산업대 교수인 박인하가 만났다.
은은한 한지를 후두둑 가르는 먹물 한 줄기가 그림이 되고 시가 되는 공간. 말은 살아서 펄펄 움직이는데,
두 사람의 말은 두런두런 무심히 오갔다.
글 박인하 사진 최민호


작가의 작업실은 광명시의 다세대주택 2층이다
광명시 광명 2동은,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연변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기거하는 곳’이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
작업실을 찾았다. 작가는 넓지 않은 작업실 바닥에 화구를
펼쳐 놓고 그림을 그린다. 희끗한 흰머리 사이로 땀이 흐
른다. 하얀 한지 위로 거침없는 붓의 선이 배어난다.
“집에서 그림 그릴 때는 팬티 바람으로 그리거든. 땀을 많
이 흘리고, 파지도 많이 나오고 해서.”
땀이 후두둑 한지에 떨어진다. 붓이 거칠다. 갈라진 붓 끝
으로 굵은 선과 가는 선이 자유자재로 나온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운 붓 끝에 묻은 먹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다. 거친 붓은 굵고, 가늘게 자유자재로 조율
되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커다랗게 펼쳐
진 한지 위로 말이 뛰어오른다.
“이런 식으로 10여 장 그리다 보면 하나쯤, 조금 맘에 드는
게 나오지.”
한 장을 완성하자마자 밀어 놓고 새 한지를 펼친다. 한쪽
에 파지가 쌓여간다. 무릎을 세운 작가는 오롯이 그림에만
집중한다. 그 안에 그만의 세계가 펼쳐진다. 작가는 굵은
붓의 한 올 한 올을 모두 이용한다. 어떤 생명의 힘이 꿈틀
거린다.
“작년에는 정말 미친 듯 ‘말’을 그렸다. 체중이 4~5㎏ 정도
빠졌다. 그러다 요즘 한 석 달 동안 붓을 쉬었다. ‘말’에 이
어 ‘춤’을 새롭게 표현하고 싶어서…. 좀 노니까 다시 체중
이 원상태로 돌아왔다.”
작가의 화두는 말과 춤이다
흐르는 붓 선에 다양한 힘을 담아내는 작가의 그림은 작가를 닮았다.
“경마장에 가서 말을 보면 참 예뻐. 아름다워. 초등학교에
가 보면 어린애들은 못생겨도 예뻐.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애들이 없어. 말도 그래. 준마는 준마대로 예쁘고….”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의 얼굴을 그린다. 몇 획의 붓 선으
로 새로운 말이 태어난다. 말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
인다.
“이 서러브레드 종은 한국 사람들이 승마용으로 타기엔
너무 크고 성격이 예민해서 안 좋아. 승마용은 제주도에서
스페인 말을 키우고 있지.”
문득 지난해 네이버의 한국 만화 거장전에 실린 작가의
‘붉은 말’이 생각난다. 첫 스타트를 끊은 작가의 작품 ‘붉은
말’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기존 웹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내공과 스타일 그리고 강렬한 색과 선이
보는 이들은 매료시킨 것.
한 편의 시처럼, 한 폭의 동양화처럼 붓으로 완성한 작가
의 작품은 생명력 넘치는 선으로 디지털 세상에 되살아나
웹툰 독자들과 조우했다.
“‘붉은 말’은 작은 종이에 그렸지만 평소 난, 큰 종이에 말
이랑 호랑이를 맘껏 그리고 있어. 정말 크게 그린 호랑이
그림이 잘된 게 있었는데… 안 보이네. 집사람이 나 몰래
팔아먹었나? 하하.”
작가의 작품을 보니 큐레이터의 본능이 발동한다. 말과 춤
이 어우러진 작가의 개인 전시회는 상상만으로도 예술적
감흥을 솟게 한다.
“개인전을 하자고 몇 번 이야기가 있었어. 홍콩에 있는 말
클럽에서도 하자고 했지. 내 말이 중국 말 같지도, 서양 말
같지도 않다고 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열린
‘신화와 전설, 잃어버린 세계로의 여행’(아람미술관) 그룹
전에서 내 그림을 보고 홍콩에서 제안을 한 거지. 그 전시
회에서 여섯 점이 팔렸어. 그때 전시한 그림은 곧 화집으로
나올 거야.”
작가의 개인전이 머지않은 느낌이다.





백성민은 가장 생명력 넘치는 선을, 신명을 다해 긋는 작가다
<라이파이>의 작가 산호 선생의 문하에서 만화를 시작한
후 다양한 모색 끝에 80년대 이후 한국적인 만화에 몰입했
다. 계기가 된 작품이 황석영의 <장길산>이다. 스스로 ‘마
당그림’이라 이름 붙인 이 만화를 두 달에 한 권 꼴로 완성
하며 4년 동안 매달렸다. 손에 익었던 모든 그림을 버리고
‘마당그림’을 손에 익힌 것. <황색고래>, <싸울아비>, <토
끼>, <삐리>, <상자하자> 등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
품도 연이어 발표했다. 그 안에는 시대와 불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가의 작품을 더는 만날 수 없었다. 만화
들이 한없이 가벼워질 때 그 무게를 잡아주던 작가의 작품
을 볼 수 없게 된 건 적어도 내겐 큰 상실감이었다. 더구나
후속작으로 성서를 만화화하기로 했던 그였기 때문이다.
백성민이 그리는 성서만화라니!
“자격이 없었던 것 같아. 성서를 만화로 그리려면 믿음이
있거나, 돈만 보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는데, 난 둘 다 아니
었어. 난 내가 하면 잘 그릴 줄 알았거든. 어떤 단계로 넘어
갈 자신이 있었지. 그런데 나이 먹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림이 안 되더라. ‘잘 그릴 나이에 왜 저렇게 그리나.’ 하
고 선배들에게 불평했던 나였는데…. 만화는 눈과 손이야.
노안이 온 지금은 팔로 그려. 아직 몸으로 그리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노안이 올 무렵 성서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했지만 이미 손
에 힘이 빠졌었다고. 진짜 잘할 줄 알았던 작업을 더는 하
지 못하게 됐을 때, 작가는 절망했다.
“만화는 작은 데다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나이 먹으면 그
게 잘 안 되는 거지. 해 봤자 구닥다리라고 욕만 먹고. 개인
작업을 하는 작가는 다 마찬가지야. 팀 작업하는 작가와는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