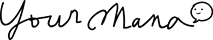‘영유아 및 어린이 출입 금지’라는 문장에서
주어를 청소년 혹은 중년으로 바꾼다면
이해하겠는가. 이 사회는 유독 아이와
엄마에게만 배타적이다.
2014년, ‘노키즈 존’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다. 2019년 현재 360개 정도의 ‘노키즈 존’이 있다고
하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동반한 외출에서 출입을 거절당한 기억이 없다. 거절당한 기억
은 없는 건 애초에 아이가 환영받지 못할 곳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
육아를 한다는 것의 어려움
‘노키즈 존’을 적극 지지하진 않지만, 이해는 한다. 아이들은 쉬지 않고 나부대니까. 부모인 나도
내 자식의 소란스러움이 싫은데 완벽한 타인은 오죽하리.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권리 주장이다. 성인은 성인끼리, 가족은 가족끼리 모이면 된다. 요즘은 다행히 어
린이를 소비 대상으로 한 키즈 존도 많다. 문제는 남녀노소 출입 가능한 공공장소다 .
이를테면 관공서, 마트, 공원, 지하철역 같은 곳들. 아이의 목소리를 거슬려 하진 않을까, 잠시 한
눈판 새 누군가를 건드리진 않을까, 조용히 시키기 위해 틀어준 휴대폰 영상의 소리가 큰 건 아닐
까. 강박 수준으로 노심초사한다.
챙겨야 하는 짐은 또 어떻고. 쓰레기를 담을 비닐봉지, 머물렀던 흔적을 지울 물티슈, 다짜고짜 투
정 부릴 때를 대비한 자잘한 간식거리, 쉬지 않고 떠드는 입을 다물게 해줄 휴대폰 그리고 충전기
까지 피난 수준의 짐을 꾸려야 외출 한 번을 할 수 있다 .
부모로 산다는 건 참 피곤하다. 과거에는 자식 입치레 잘 시키면 그만이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적당한 체형을 유지하게 먹는 걸 신경 써야 하고, 특별한 재능은 뽐내지 못해도 보통 정도는 하
게끔 사교육도 적당히 시켜야 하며,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위해 다른 엄마들과 교류도 맺어야 한다.
한 시대를 풍미한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프린세스 메이커> 속 가상의 자식을 공주로 키워내는
일도 이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다. 공주, 왕자는 꿈도 꾸지 않는다. 그저 제 앞가림하는 보통 사람
으로 키우고 싶을 뿐이다. 소박한 목표임에도 할 일이 태산이다. 집에서는 사람답게 키우느라 커
피 한 잔 즐길 여유 없이 바쁘고 피곤한데, 밖에서는 ‘맘충’으로 욕먹을까 봐 눈치 보며 행동하려
니 죽을 맛이다. 열 번 조심해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다. 그 몇 번의 실수가 나를 판단하
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억울해도 별수 없다. 억울한 건 내 사정이지 상대방의 사정이 아니니까 .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다. 아이들과 산책이나 할까 하고 공원에 갔었다. 오순도순 산책하다 요구
르트를 하나씩 달콤하게 나눠 마셨는데, 빈 병 버릴 곳이 없더라. 이따 버려야지 생각하고 손에 꼭
쥐고 다녔다. 순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아이를 챙기느라 나도 모르게 빈 요구르트병을 길가에
두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한 여성분이 바로 뒤쫓아 오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라며 훈계했다.
“깜빡하고 두고 온 거예요”라고 말하려다 참았다. 혹시 일이 커질까 싶어 연신 죄송하다 머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차’ 하면 욕먹는다. ‘맘충’이라는 거대한 벌레가 되지 않으려
면 늘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 현실에서도, 작품에서도.
육아를 만화로 그리는 것의 어려움
2012년 여름, 둘째가 막 6개월에 접어든 때였다. 잠든 아이들 옆에서 궁상맞게 엎드려 A4용
지에 모나미 볼펜으로 엄마라는 존재는 우주의 먼지보다 못하다는 하소연을 만화로 그린 게
<나는 엄마다>의 시작이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선 육아의 힘듦이 조명받지 못했다. 횡단보도
에서 초록 불이 되었을 때 길을 건너는 일처럼, 육아는 엄마의 당연한 업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
다. 엄마들의 넋두리를 세상은 모성애의 부재쯤으로 생각했다.
위로와 공감이 필요했던 많은 엄마는 육아 카페에 모여 한 맺힌 넋두리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다
독였다. 나도 그 무리 중 한 명이었고. 같은 처지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이거다 싶어 육아의 적나라함을 만화로 그려 올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동지, 그리고 동지의 측근
들께서 격하게 공감해주셨다. 강한 공감대 형성을 주춧돌 삼아 정식 데뷔까지 했다. 화려한 그림
실력, 유려한 글솜씨는 없지만, 민간인 사찰을 의심케 하는 현실적인 소재 선정과 솔직한 표현이
<나는 엄마다>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런데 요즘 장점이 흐릿해졌음을 나도 느끼고, 독자들도 느낀다. 예전에 비해 재미없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역량 부족이라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연재 초보다 자체 검열의 기준이 높아졌기 때
문이다. 연재를 하는 4년간, 엄마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에서 혐오로 변했다. 숭고한 희
생, 미래의 희망으로 포장되던 수식어는 ‘맘충’, ‘천덕꾸러기’로 대체된 지 오래다.
처음 정식 연재가 결정되었을 때, 딱 이 두 가지 만큼은 다루지 말자 다짐한 게 있다. 바로 종교와
정치다. 육아를 중심으로 한 ‘일상툰’에서 종교와 정치 이야기를 할 일은 거의 없어 보였지만, 소
위 말하는 댓글난이 난리 나는 사태를 피하고자 나름의 기준을 세운 것이다 .
4년이 지난 지금 종교와 정치를 넘어 성차별, 독박 육아, 비혼, ‘맘충’ 등 피해야 할 카테고리가 되
레 늘었다. 혐오가 세상에 만연해지고 그 중심에 결혼, 출산, 육아가 있다 보니 그릴 게 없다. 미혼
의 입장에서 그렸다면 넘어갔을 소재도 엄마의 입장에서 그리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비난받지
않으려면 몸 사려야 한다. 예전에 소재 선정에 소비하는 시간이 하루였다면 요즘은 일주일을 고
민해도 시간이 모자라다. 이걸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콘티까지 구상했다 엎은 적도 여러 번이
다. 슬슬 연재를 접어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육아를 한 지 9년째, 한숨 돌린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사지에 각기 다른 인격체라도 달린
듯 행동하던 아이들이 식당에서 조용히 앉아 밥을 먹는다. 휴대폰 없이, 공포의 카운트다운 없이
도. 기적이 일어난 거다. 지난 9년간 나는 늘 죄인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죄가 아닌데, 아이와
함께 있으면 죄송스러울 일이 많다. 철저한 약자의 입장을 경험한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보통의
성인보다 아이와 부모를 향한 비난이 더 크다.
물론 욕먹어 마땅한 사례도 있다. 그러니 조건 없는 이해와 배려를 바라는 건 아니다. 적당한
관용을 바란다. 소수의 행동 때문에 다수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건 잔인하다. 어차피 인간
사회는 민폐의 사슬이다. ‘무개념’ 청소년, 배려 없는 청년, 고집스러운 중년 등 민폐를 끼치는
존재는 어느 계층에나 가득하다. ‘영유아 및 어린이 출입 금지’라는 문장에서 주어를 청소년 혹은
중년으로 바꾼다면 이해하겠는가.
이 사회는 유독 아이와 엄마에게만 배타적이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엄마는 조심하며 산다. 현실
에서의 조심은 작품에서도 이어진다. <나는 엄마다>의 강점인 솔직함을 되찾을 수 있게 너그러
운 시선으로 고군분투하는 엄마들을 바라봐 주길 바란다. ◆
순두부 | 8살, 9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 다음웹툰에서 매주 화요일 <나는 엄마다>라는 ‘일상툰’을 연재중이다.
엄마들, 엄마가 아닌 사람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그린다.